Low sales no problem for this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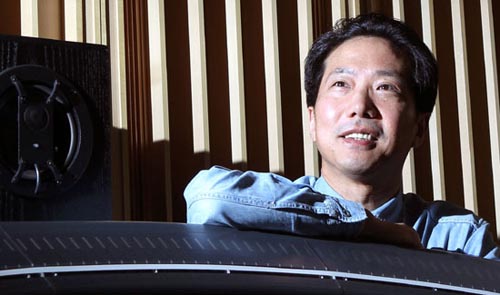
Record producer Kim Young-il fell in love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when on assignment as a photographer. By Byun Seon-gu
Kim Young-il is pretty jovial for a person who introduces himself as someone whose business is “destined to go bust.”
The 49-year-old is CEO of the gukak (traditional Korean music) record company AkdangEban, Inc., whose sales average around 30 albums per year - 20 for sanjo (a solo genre and one of the most advanced forms in Korean music) and 10 for pansori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inging) albums.
Yet none of that bothers him. He says he’s just doing “a job he wanted to do so much it was painful.”
Kim got his start in the visual arts as a photography major at ChungAng University, where he was one of the school’s most sought-after photographers.
In 1994, his life changed when he was hired to photograph 28 Korean musicians.
“When I was asked to do a shoot for pansori master Chae Soo-jeong, I asked her to sing so I could get a more natural shot,” he said. “And she sang “Pyeonsichun,” a song about spring and the transience of life. I was so mesmerized that I couldn’t even snap the shutter. Before that moment I had turned my back on gugak but that moment changed everything.”
Kim spent the next few years searching for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traveling all around the nation to document their work. The more he traveled, the more he began to fear that the music was disappearing.
“I would stay up at night listening to pansori by singers on Mount Jiri,” he said. “Then one day I suggested that we record the music but no one really thought it was a good idea. ‘Who would buy and listen to traditional Korean music now?’ they said.”
He went ahead with the project anyway and made 300 recordings by 150 pansori masters in 10 years but couldn’t find a record company willing to release the albums. So he set up AkdangEban, Inc. himself.
His preferred recording environment is in a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he now travels all around the nation to do recordings in a variety of hanok, which he believes are ideal spaces for tradition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originally created in hanok. The music and instruments are naturally attuned to hanok. The humidity of the village and the lay of the land give each house different vibrations,” he said. “When doing a gayageum sanjo recording at Soswewon in Damyang, South Jeolla, we were able to capture the sound of the wind and when we were doing a gayageum recording at a hanok in Hamyang, South Gyeongsang, the chirping of birds enveloped the gayageum playing. But I didn’t do anything to change it.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e, humans are the noise.”
Thus far, he has recorded the sounds of 40 hanok and is trusted by some of the nation’s most famous traditional musicians.
Renowned gayageum player Hwang Byung-ki has said that Kim is an “enormously unique and essential being in Korean traditional music” who pursues the “sheer beauty of gugak.”
Kim seems flattered yet modest about his role in traditional music preservation.
“I cannot bear something to disappear,” he said. “That’s why I took pictures - to keep what I see. I also feel thrilled by recording and releasing music.”
By Kim Ho-jung [estyl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사진 찍다가 국악에 미쳤다 “돈 까먹어도 마냥 좋은걸요”
악당이반 대표 김영일씨 “우리소리 기록 누군가는 해야 … 1년 1000만원씩만 손해보자”
이쯤 되면 거의 ‘광인(狂人)’이다. 8년째 국악 앨범 50여 종을 만들어온 ‘악당(樂黨)이반’ 김영일(49) 대표다. 그를 만나자마자 바로 물었다. 국악 음반은 일년에 몇 장 팔리는가. 그는 “산조 20장, 판소리 10장”이라고 답했다. 스스로 “망하기로 작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한 술 더 뜨기 시작했다. 일반CD보다 음질이 좋은 수퍼오디오CD, 즉 SACD로 국악 앨범 11 종류를 내놨다. CD 한 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장 기준 대략 800~1200만원. SACD는 같은 기준으로 2500만원이 들어간다. 한 장에 3만원 꼴로 파는데, 100장을 못 채운다. “일년에 1000만원만 까먹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것 참 큰일났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런데도 표정은 행복하다. “몸살 앓도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 사진학과 81학번인 그는 잘 나가는 사진작가였다. 기업 총수들 사진을 도맡아 찍었고, 여러 잡지에서 단골로 청탁을 받았다. 1994년,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젊은 국악인 28명을 찍은 직후였다. “소리꾼 채수정(42)의 사진을 찍으면서 한 자락 불러보라고 부탁했어요. ‘편시춘(片時春)’이 터져 나왔어요. 소름이 돋아 셔터를 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죠. 국악 비슷한 것만 흘러나와도 귀를 닫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날 이후 소위 180도 달라졌죠.”
‘편시춘’은 인생이 봄날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내용의 단가(短歌)다. 그는 이 노래를 듣고 그야말로 봄꿈 꾸듯 소리에 파묻혔다. 전국의 고수를 찾아 10여 년을 보냈다.
“지리산에서 몇 년간 소리와 싸움한 사람들과 만나 밤새 소리를 즐겼어요. 멀리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살금살금 문지방을 넘어왔죠. 이걸 좀 기록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소리꾼들은 한결같이 ‘요즘 이걸 누가 사서 들어요’ 하더군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 그가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산 너머 산. 10여 년간 명창 150명을 녹취해 만든 마스터테이프 300장을 들고 여러 음반사를 두드려졌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그가 음반사 ‘악당이반’을 차린 이유다.
녹음 스튜디오는 전국 각지의 오래 된 한옥이다. “원래 우리 음악은 한옥에서 했죠. 한옥에 맞춰진 악기와 음악입니다. 마을의 습도, 지형의 울림이 집집마다 다른 소리를 만들어요. 전남 담양 소쇄원에서 가야금 산조를 녹음할 땐 벌레 소리, 대숲이 바람소리와 문지방 흔들리는 소리까지 담았습니다. 경남 함양 한옥에서 녹음했을 땐 새 우는 소리가 가야금 소리를 뒤덮었죠. 그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연 입장에선 인간이 소음이니까.”
그는 지금까지 한옥 40여 채의 소리를 담아냈다. 음질이 좋은 SACD를 고집하는 이유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은 “김영일은 국악계에서 대단히 독특하면서 필요한 존재다. 돈이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국악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돈줄’은 따로 있다. 89년 설립한 영상회사 ‘그루비주얼’의 매출이 8년 새 100배 뛰었다고 한다. ‘악당이반’은 이 수익을 가져다 쓴다. “저는 뭔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보이는 걸 잘 담아놓으려 사진을 시작했죠. 음악 또한 담아놓고 내놓는 데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그는 올해 또 ‘거덜나는 사업’을 할 생각이다. “배경·경력 없이 실력만 있는 클래식 연주자를 찾고 있어요. 그들의 특출한 음악을 SACD로 만들어 주려고요.” 그의 ‘광시곡(狂詩曲)’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