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opportunities for a stupid ‘s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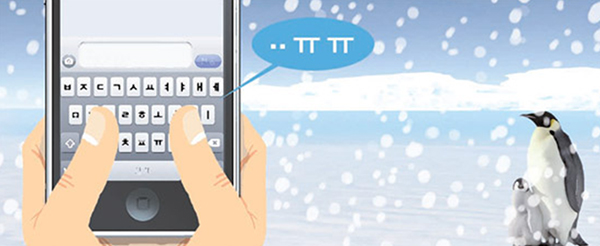
We’ve all had the embarrassing experience of sending a text message to the wrong person. You may have sent a message intended for your boyfriend to your father. Or messages talking about your boss to a co-worker could have been sent to the boss instead. But these are harmless mistakes.
However, if you are having an extramarital affair and send a message intended for your girlfriend to your wife, that’s a different story. You have to prepare for a war, indeed. And it will result in a casualty, as well. Anyone who lacks prudence and dares to have an affair is either stupid or reckless, or both. The age of text messaging brings both comedy and tragedy. A slip of a finger can lead to tremendous social impact.
Not so long ago, a prosecutor who intended to send a text message to a colleague regarding the half-hearted prosecution reform actually sent it to a hungry journalist. The prosecutor ended up quitting his job. He was browsing his “recent calls” list to look for his colleague, but mistakenly chose the reporter whom he had just spoken with.
Earlier this year, a Blue House secretary thought he had sent a text message celebrating the ruling party’s nomination of his friend as a candidate in the then-upcoming general election. But the message was delivered to a spokesperson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led to allegations of Blue House intervention in the general election. It is an age of finger scandals.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SMS, or short message service. On Dec. 3, 1992, British computer engineer Neil Papworth of Sema Group sent Richard Jarvis, a technology director at Vodafone, a text message that read “Merry Christmas.” Thanks to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six billion mobile phone users worldwide send and receive seven trillion SMS messages every year. That is 200,000 texts every second.
However, SMS is not as powerful as before. With the rapid spread of free mobile instant messaging services such as KakaoTalk in Korea, users are using SMS - which charges a fee for sending messages - less and less. KakaoTalk’s 27 million users send 4.1 billion messages a day, or 150 per user.
Yearly per-user SMS messages on the three leading mobile service providers drastically decreased from 7,240 in 2010 to 5,060 in 2011 to 1,485 in the first half of 2012. In response, the providers jointly developed a mobile messenging service, Joyn, to be unveiled as early as this week. Consumers can now choose from a greater variety of text message services. But we shouldn’t only welcome the change. The risk of “finger scandals” is growing, too. Once you spill the water, there is no way of putting it back into the glass. Before you regret the slip of your finger, you need to make sure your message is delivered to the right person.
*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Bae Myung-bok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엉뚱한 곳으로 잘못 보내 당황하거나 낭패를 본 경험 말이다. 오빠-연인의 다른 말-에게 보낸 문자가 아빠에게 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힌 아가씨가 있고, 술 먹고 동료에게 보낸 문자-상사에 대한 뒷담화-가 동료와 이름이 같은 상사에게 가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직장인도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 줄만 하다. 하지만 애인에게 보낼 문자를 아내에게 보낸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 그 정도 조심성도 없으면서 한눈 팔 생각을 한 사내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문자메시지 시대의 희비극이다. 살짝 잘못 누른 손가락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검찰 개혁 주장의 진의를 동료에게 전하는 문자메시지가 엉뚱하게 기자에게 가는 바람에 잘나가던 검사 한 명이 얼마 전 옷을 벗었다. 스마트폰의 ‘최근 통화목록’에서 동료 검사 이름을 찾다 무심코 방금 통화를 한 기자 이름을 눌러버린 것이다. 올 초 어느 청와대 수석은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공천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하필이면 야당 대변인에게 잘못 보내 청와대의 총선 개입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손가락 스캔들’이다. 필화(筆禍), 설화(舌禍)에 이어 ‘지화(指禍)’의 시대다. 영어로 SMS(short message service)로 부르는 문자메시지가 선을 보인지 올해로 꼭 20년이다. 1992년 12월 3일 영국의 컴퓨터 엔지니어인 닐 팹워스가 영국의 이동통신회사인 보다폰의 기술 부문 책임자인 리처드 자비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보낸 것이 최초의 문자메시지였다. 모바일 기술의 혁명적 발전 속에 지금은 60억 명에 달하는 전세계 휴대전화 가입자가 연간 7조 건의 SMS를 발송하고 있다. 1초당 20만 건이다. 그러나 SMS의 위세가 전 같지 않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유료 서비스인 SMS가 힘을 잃고 있다. 카카오톡의 국내 가입자 2700만 명이 하루 보내는 메시지만 41억 건이다. 1인당 150 건 꼴이다. 그 탓에 통신 3사의 1인당 연간 SMS 발송 건수는 2010년 7240건에서 지난해 5060건, 올 상반기에는 1485건으로 급감했다. 위기를 느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조인(joyn)’이 이르면 금주 중 선을 보인다고 한다. 소비자로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만큼 지화의 위험도 커진다고 봐야 한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손가락 잘못 눌러 후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일이다. 배명복 논설위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