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owth problem grows
Published: 08 Feb. 2013, 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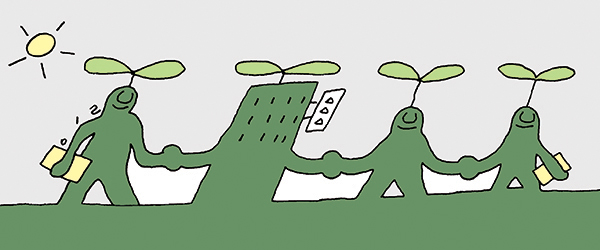
“Korea became one of the top seven exporters in the world.” A former minister said that as he looked back on the five year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e knew from early on it would be very hard to fulfill Lee’s core pledge of 747: achieving 7 percent annual growth, per capita income of $40,000 in 10 years and joining the top seven economies. But at least when it came to exports, Korea became one of the top seven powers.
In fact, President Lee focused on exports more than any other recent president. He understood the role of exports in Korea’s economy and aggressively stimulated them. He was a master of exchange rates. He personally oversaw the currency policy. When the value of won soared, he constantly checked with ministers to see if the exchange rate was acceptable. As a former corporate CEO, h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exchange rates, which determine the unit price of exported goods. Thanks to various factors, the Korean economy benefitted from a low won for the past five years. The won-to-dollar exchange rate was the lowest except for dur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f the late 1990s and the won-to-yen rate was the lowest in history.
The president led the export drive from the front line, but his overall economic achievement fell far short of his pledges. The average growth in the five years of the Lee administration was 2.9 percent. There were two crises in the perio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8 and the ongoing European crisis. However, in the same period, the growth rate of the global economy was 2.88 percent, so the Korean economy performed not much better than the global average. While a low won value boosted exports, domestic consumption shrunk because of growing household debts. An insider at the Bank of Korea said we’ve forgotten the fact that the economy can only fly when its two wings -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 move together.
Last year’s growth was 2 percent. It was the lowest the economy has seen except for the negative 1.9 percent growth in 1980 during the second oil shock, the negative 5.7 percent growth in 1998 dur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and 0.3 percent growth in 2009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should have make various efforts to boost the economy, but becaus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last December, no full-scale economic stimulus plans were prepared.
The growth rate is more than a mere number. When the rate goes up by 1 percent, we have 60,000 to 70,000 more jobs and an additional 2 trillion won ($1.8 billion) in tax revenue. When the economy grows smoothly, we will have an unexpectedly easy solution to the household debt problem and financing Park Geun-hye’s welfare promises. But the new administration is set to start very soon an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economic growth. A securities company executive said, “As the low-growth trend continues, economic entities are losing confidence. And that is a sign of a crisis in the making.” Economic growth is no panacea. However, hardly any economic problem can be dealt with without growth.
*The author is a deputy busines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Lee Sang-ryeol “우리가 세계 7대 수출 대국이 됐어요.” 지난해 연말 한 전직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MB의 핵심 공약인 '747(연평균 7% 경제성장-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은 일찌감치 날개가 꺽였지만, 수출만큼은 7대 강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감격이 묻어났다. MB는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 않은 수출 대통령이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역할과 비중을 꿰뚫어봤고, 수출을 적극 독려했다. 환율에 있어선 최고수였다. 그는 환율을 직접 챙겼다. 원화값이 급등하면 수시로 장관들에게 “환율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참모들의 입력도 있었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그 자신이 수출단가를 좌우하는 환율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한국 경제는 지난 5년간 ‘원저’를 만끽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값은 외환위기 시절을 제외하곤 가장 낮았고,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값은 사상 최저였다. 대통령이 수출을 진두지휘했지만 경제 전반의 성적은 애초 공약에 너~무 못 미쳤다. MB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은 2.9%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가 있긴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이 2.88%인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평균치 보다 크게 잘한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수출은 ‘원저’를 타고 훨훨 날았지만, 가계부채에 짓눌린 빈약한 내수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는 수출과 내수라는 양쪽 날개가 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날아오른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정부의 미흡한 성장률에 결정타를 먹인 것은 작년이었다. 작년 성장률 2%는 2차 오일쇼크때인 1980년(-1.9%), 외환위기때인 1998년(-5.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3%)을 제외하곤 한국경제가 겪어본 적 없는 저성장이다. 예전 같았으면 곳곳에서 경기를 부양하라고 난리를 떨고 정부도 수선을 피웠겠지만,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는지 대대적인 경기 진작책은 나오지 않았다. 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장률 1%가 오르면 6만~7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2조원 늘어난다.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하지만 고성장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을 맞은 747의 트라우마일까. 새 정부 출범이 코 앞인데 성장 담론은 실종 상태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급 인사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증권사 간부는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게 위기 징후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없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제 문제는 거의 없다. 이상렬 경제부문 차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